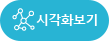| 항목 ID | GC09000012 |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백제 |
| 집필자 | 장인성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백제 사비도성에서 건물과 유물에서 구현되었던 신선 세계.
[백제의 수도 사비에 신선세계를 구현하다]
백제 사비도성에는 아침저녁으로 신인(神人)이 서로 왕래하였다는 세 개의 산[삼산]이 있었다. 신인은 신선이면서 산신이기도 하다. 신인 즉 신선이 사는 곳은 인간 세계가 아닌 선경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백제인은 신선이 사비도성을 선경으로 변모시키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삼산뿐만 아니라 사비도성의 유적이나 유물에서도 신선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무왕이 조성한 부여 궁남지, 백제 금동대향로, 산경문전 등에서 신선 세계를 구현하였다.
[사비의 삼산신앙이 주변 나라에 영향을 주다]
『삼국유사』에는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삼산 위에 신인(神人)이 거주하며 아침저녁으로 서로 왕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인은 도교의 독특한 수행법을 연마하여 득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상적인 존재이다. 또한 신선이면서 지역을 지키는 산신(山神)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삼산의 신인은 영원한 생명을 구가하는 신선이면서 사비도성을 지키는 산신이었다. 이와 같은 삼산신앙은 사비도성이 신선 세계이자 사비도성을 신인이 지켜 준다는 백제인의 믿음이었다.
삼산은 부산(浮山)·오산(吳山)·일산(日山)을 일컫는다. 사비도성의 삼산 가운데 현재 위치가 확실한 산은 부산이다. 부산은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백마강 강가 들판에 있는 높이 106.8m의 야트막한 산이다. 부산은 야트막하지만 들판에 있어 높아 보인다. 구교리 구드래나루 제방 또는 부소산에서 맞은편에 있는 부산을 바라보면 산이 우뚝 솟아 보인다. 옛날 청주 고을에서 심한 홍수가 나서 떠내려 온 산이라 ‘부산’이라고 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현재 부여에 오산(吳山)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염창리 뒤에 있는 높이 180m의 오산(烏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오산(吳山)이 ‘오산(烏山)’으로 한자 표기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산 가운데 일산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금성산을 일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뒤에 있는 금성산은 부여 나성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부소산과 마주하고 있다. 금성산은 규모나 위치로 보아 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다.
삼산의 위치를 보면 사비도성 가운데 있는 금성산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각각 2㎞ 떨어진 곳에 오산과 부산이 나란히 있다. 삼산의 정상에 오르면 사비도성 내부는 물론 멀리 논산, 장항, 익산, 서천까지도 볼 수 있다. 나성을 중심으로 보면 나성의 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일산[금성산]과 서쪽 백마강 건너편의 부산, 동쪽 백제 왕릉 구역이 내려다보는 오산이 있다. 도성은 의례를 거행하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산은 물론 부산과 오산도 사비도성의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성하고 신비한 의례 공간으로 사비도성에서 삼산은 의미가 크다.
사비도성의 삼산은 신라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신라의 삼산은 나력·골화·혈례이다. 신라 삼산은 왕경인 경주를 중심으로 외부와의 경계 지역에 있었다. 설화에 의하면 김유신이 고구려 첩자 백석의 속임수에 빠져 적국인 고구려를 염탐하러 갈 때 두 여인이 김유신을 따라왔으나 골화천에 이르자 또 다른 한 여인이 김유신을 따라왔는데, 세 여인은 바로 나력·골화·혈례의 산신들이었다고 한다. 세 여인은 김유신에게 백석이 고구려의 첩자임을 알려 위기에서 구하였다고 한다. 신라 삼산의 산신은 호국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일본에서도 삼산은 도성의 구성 요소로 매우 중요하였다. 일본 고대 도성인 후지와라쿄[藤原京]·헤이조쿄[平城京]·헤이안쿄[平安京]에 각각 삼산이 있었다. 그 가운데 후지와라쿄의 야마토삼산[大和三山]은 현재 나라현 중부 가시하라[橿原]시에 있는 가구야마[香具山]·우네비야마[畝傍山]·미미나시야마[耳成山]를 가리킨다. 후지와라쿄는 삼산의 중간 지점에 있다.
[궁남지 연못에 신선이 살고 있었네]
무왕은 재위 말기인 634년(무왕 35) 3월 궁궐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7.8㎞]에서 물을 끌어 들였다. 그리고 못의 사방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못의 가운데에는 섬을 만들어 방장선산(方丈仙山)에 비기었다. 방장선산은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이다. 무왕이 궁 남쪽에 조성한 못에 방장선산을 본뜬 섬을 축조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백제에서 신선 세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신산은 봉래산·영주산·방장산으로 신선이 산다는 신선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신선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은 중국 전국 시대 중기에 발해만 연안에 있는 나라에서 성행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제는 발해에 갔을 때 신선과 불사약이 있다는 삼신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진시황제는 서시(徐市)[徐福]에게 어린아이들을 배에 태우고 가서 발해에 있다는 삼신산을 찾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중국 역대 황제들은 역시 신선을 희구하며 삼신산을 모방하여 각종 금수를 기르고 진기한 초목을 심은 동산인 원유(苑囿)를 축조하여 신선 세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진시황제는 함양의 궁전에 난지(蘭池)를 조성하고 봉래산과 영주산을 축조하여 삼신산을 도성 안으로 넣었다. 백제 무왕과 동시대 시대인 중국의 수·당대에도 이런 원유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수 양제는 서원에 큰 못을 파서 삼신산을 조성하였고, 당 태종은 대명궁에 태액지를 파고 안에 봉래산을 만들었다. 삼신산은 신선이 거주하는 신비로운 선경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욱더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백제에는 무왕 이전에도 궁남지와 같은 원지를 조성한 역사가 있다. 백제 진사왕은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진기한 새와 특이한 꽃을 길렀으며, 동성왕은 궁궐 동쪽에 임류각을 세우고, 못을 파서 짐승을 길렀다. 백제 원지는 중심이 못이고, 못 가운데 산을 만들었으며 못 주위에는 진기한 짐승과 특이한 꽃을 길렀거나 버드나무를 심었으며, 못 가운데나 주변에는 누각과 같은 건물이 배치되었다. 익산 왕궁리 원지도 못·산·건물 등을 갖추고 있어 백제 원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백제 원지는 신라의 월지 조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라 문무왕이 궁궐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월지로 추정된다. 월지의 못 안에는 대·중·소 세 개의 섬이 배치되어 있는데 삼신산을 상징한 것이다.
[사비 지역에 신선이 살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 주는 유물]
신선 세계를 구현한 유물로 도교적 세계관을 보여 주는 백제 금동대향로가 있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발굴된 백제 금동대향로는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백제 금동대향로의 형태나 조형미가 빼어났기 때문이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형태나 도상의 특성으로 보아 중국 한대의 박산로를 모델로 하였다. 전한 무제 시기에 출현한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박산로는 신선 사상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신선이 사는 세계를 구상화한 것이 박산로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박산로는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뚜껑·몸통·받침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뚜껑에는 능선 모양의 중첩된 산악을 묘사하였다. 뚜껑의 정상에는 목에 보주를 끼운 봉황 한 마리가 깃털을 힘차게 펴고 세상을 응시하고 있다. 가장 위에 있는 산봉우리에는 5마리의 새가 앉아 있고 사이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뚜껑에는 호랑이 같은 맹수류와 조류, 사람 얼굴에 짐승의 몸을 하거나 사람의 얼굴에 새의 몸을 한 상상 속의 동물도 등장한다. 또 말을 타고 수렵하는 인물과 지팡이에 의지하여 거니는 인물도 보인다. 연꽃잎이 8잎씩 3단으로 둘러진 몸통에는 새·물고기·악어·날개 달린 물고기·높은 관을 쓰고 신비한 짐승을 타고 있는 선인 모양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받침대에는 똬리를 틀고 강렬한 힘으로 백제 금동대향로를 받들고 있는 용이 조각되어 있다. 백제 금동대향로의 받침대의 용과 뚜껑 위의 봉황은 인간이 희구하는 이상향과 백제의 드높은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봉황은 백제 금동대향로의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이다. 봉황은 상서로운 새로 새 중의 왕이다. 봉황의 출현은 성왕의 출현, 질서의 확립, 그리고 태평성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백제 금동대향로의 정상에서 날갯짓을 하는 봉황은 성왕의 출현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백제인의 정신 세계는 물론 신선 세계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백제 금동대향로에 나타난 신선 세계의 모티브는 백제 와전 최고의 걸작인 부여 외리 출토 봉황산경문전과 인물산경문전에도 보인다. 봉황산경문전에는 위쪽에 봉황과 구름이, 아래쪽에는 산이 배치되어 있다. 봉황은 중앙에 있는 산 위에 있다. 봉황산경문전은 신선 세계와 신선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봉황을 배치하여 더욱 신비감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산경문전에는 첩첩이 있는 산들 사이에 누각과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신선 세계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4월 9일 부여 쌍북리 사비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발굴하면서 수습한 목간 가운데 ‘오석□십근(五石□十斤)’이 묵서된 목간이 공개되었다. ‘오석’은 오석산으로 추정되는데, 단사(丹砂)·웅황(雄黃) 등 다섯 가지의 광물질로 제조된 선약(仙藥)이다. 오석산은 중국 후한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수·당 시대까지 성행하였는데 신선술의 추구와 밀접한 연련성이 있다. 쌍북리에서 발굴된 목간을 통하여 사비도성에서 백제인들도 오석산과 같은 선약을 복용하였으며 신선 세계를 동경하며 선약을 통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장인성, 『한국 고대 도교』(서경문화사, 2017)
- 김영심, 「백제의 도교 성립 문제에 대한 일고찰」(『백제연구』5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1)
- 김영심, 「백제 문화의 도교적 요소」(『한국고대사연구』54, 한국고대사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