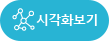| 항목 ID | GC09001315 |
|---|---|
| 영어공식명칭 | Soepum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강성복 |
[정의]
충청남도 부여 지역에서 농삿소를 빌려 쓰고 품으로 갚는 농사 관행.
[개설]
농작물의 재배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비료를 주어 수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갈이’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이다. 갈이는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증진하고자 이랑과 그루 사이를 갈아엎는 작업이다. 갈이는 경작지에 따라 밭갈이와 논갈이로 크게 나뉘고, 계절에 따라서는 봄갈이, 여름갈이, 가을갈이로 나뉜다. 부여 지역의 전통사회에서 모든 농사는 가축의 노동력에 의지하여 갈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농삿소를 빌려 쓰고 나중에 품으로 갚는 ‘쇠품’이 시행되었다. 농삿소는 농가의 가장 큰 재산이었고, 부농이 아니면 소를 보유한 집이 드물었다. 농삿소는 함부로 빌려주지 않았고, 갈이를 위하여 대여해 줄 경우 대가를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특징]
부여 지역의 쇠품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소를 빌려서 직접 갈이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를 보유한 주인이 와서 일을 해 주면 품으로 대신하여 갚는 방식이다. 이때 쇠품은 마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농삿소를 하루 빌리면 3일 품값을 쳐 주었다. 소 주인이 직접 갈이를 하는 경우 4일 품으로 늘어난다. 그런가 하면 모내기 철에는 논의 면적으로 쇠품을 정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소 주인이 한 마지기[약 660㎡] 논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써레질을 해 주면 2~3일 품을 받았다. 어쩌다 품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 돈이나 쌀로 품값을 받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농삿소가 귀한 탓에 품값이 매우 비쌌다.
[현황]
농경의 발전 단계에서 소를 이용한 갈이는 농업 생산력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온 원동력이다. 20세기 후반 농업 기술의 발전과 기계화 영농은 갈이에도 혁신을 가져왔다. 그 결과, 경운기·트랙터·콤바인과 같은 농기계가 보급되어 갈이, 써레질, 모내기, 수확, 탈곡, 운반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부여 지역에서는 기계화 영농의 확산으로 소를 이용한 농사의 전통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농삿소를 빌리고 품으로 갚는 쇠품의 관행도 현재 소멸되었다.
- 『백마강』 (부여군, 2008)
- 『비홍산의 품 자락』 (부여군, 2008)
- 『부여의 무형문화유산』 (부여군, 2020)
- 『한국 생업 기술 사전』 -농업 2(국립민속박물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