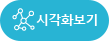| 항목 ID | GC60001677 |
|---|---|
| 한자 | 光州邑城南門鎭南門 |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 유형 | 유적/건물 |
| 지역 | 광주광역시 동구 |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 집필자 | 이수경 |
| 원소재지 | 광주읍성 남문 진남문 - 광주광역시 동구 |
|---|---|
| 성격 | 성문 |
[정의]
[개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류와 문인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광주읍성 남쪽은 '진남문(鎭南門)'이라는 이름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었다. 진남문의 '진남(鎭南)'은 "남쪽을 누른다"는 뜻인데, 여기서 남쪽은 일본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광주처럼 남문을 진남문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았다. 1896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주에 머문 지도군수 오횡묵이 남긴 기록에 "남문 안에는 광명석(光明石)이 있는데 광주 읍내의 고적(古蹟)이다."라는 내용에서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재명석등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위치]
광주읍성 남문 자리는 광주도시철도1호선 문화전당역 6번 출구 근처에 있었다. 남문 일대가 온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 흡수되면서 옛 흔적까지 밋밋한 평지로 바뀌거나 대형 건물에 가려진 결과이다. 남문을 통과하면 광주천과 증심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고, 예전에는 너릿재를 넘어가면 화순, 능주목으로 갈 수 있었다. 보통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오갈 때 이용하였다.
[변천]
광주읍성 남문 진남문에서 북문 공북문으로 통하는 길은 조선시대에도 잘 발달되어 있었다. 1930년 광주읍성 일대가 광주읍으로 승격될 시기에 북문통과 남문통 일부를 합쳐 본정(本町)이라고 불렀다. 전남도청, 헌병대본부, 경찰서, 검찰청 등 주요 통치 기구가 남문 진남문에서 북문 공북문으로 통하는 도로 중심으로 자리하였다. 현재의 충장로에 해당한다.
[형태]
광주읍성 성곽의 형태를 살펴보면 1872년 지방지도 등의 고지도에서 방형으로 표시되어 있다. 광주읍성에는 동서남북을 향한 성벽의 중앙에 각각 1개씩 4개의 문(門)이 있었다. 문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동지도(海東地圖)』는 광주읍성 사대문 모두를 홍예문처럼 그렸다. 그 외 남문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하지 않고 있다.
[현황]
광주읍성 남문 진남문 자리에 2006~200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하면서 지표면 아래에서 85m에 달하는 남쪽 성벽의 유허를 발굴 조사하였다. 성벽을 이루고 있었던 성돌을 해체 보관하여 오다가 2014년 당시 읍성의 일부 구간을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의의와 평가]
광주읍성 남문 진남문은 광주읍성의 규모나 의미 등을 역사적 변천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하면서 남문을 포함한 유적이 발굴되어 광주읍성의 가치를 확보하였다.
- 『광주읍성 발굴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전남문화재연구원, 2008)
- 『1896년 광주 여행기』(광주역사민속박물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