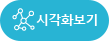| 항목 ID | GC05702086 |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 집필자 | 박순호 |
| 채록|수집|조사 시기/일시 | 1982년 8월 10일 - 「임피의 명당 노와 봉용」 채록 |
|---|---|
| 채록지 | 「임피의 명당 노와 봉용」 채록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
| 성격 | 설화 |
| 주요 등장 인물 | 강노인|손님 |
| 모티프 유형 | 전설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에서 채록된 설화.
[채록/수집 상황]
1982년 8월에 채록된 「임피의 명당 노와 봉용」 설화는 『군산 시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설화는 조사자가 채록을 유도하자 생각 난 듯이 자청해서 시작한 것이다.
[내용]
이 골[고을]안이 전설이면서도 그 명당이 얘기요. 근디 이 골 안에서 된 일인디, 이 강씨 할아버지 집안여. 이 할아버지 집안이 인자 되어진 일이여. 하도 하도 가난헌게 이 사람이 외를 놓고서. 참외를 놓고서 인자 서너 개가 익어 갖고서는 누런허니 익었는지 그놈을 따서 제사를 지낼 판여 그날 저녁으, 참외 제(祭)를 지내, 지낼락 허는 판여. 그 강씨가 가난허기가 짝이 읎어. 어떻게 참 기가 맥히게 가난허단 말여. 근디 그 참외막을 짓고서 인자 그렇게 있는디, 그 어떤 노인 하나가 기양 바듯이 기어서 오는디 가서 참 캄캄한 구름은 그냥 져서 우지라지 오는디 그 영감이 외막을 올라옴서.
“나 좀 쉬어 가자.”
인자 올라오는 것여. 근디.
“내가 배 고파서 죽겄다고.”
인자 금서 바듯이 올라와. 근게 그날 저녁으 참외 제를 지낼 참외를 그 놈을 세 개를 제일 좋은 놈으로 따다가 그 노인, 그 노인네 주었어.
“이놈을 잡수쇼.”
그래 그놈을 감식(甘食)허게 참 잘 먹었어. 먹고 나닌게 그냥 그 구름으로 비가 오는디 그치들 안혀. 그냥 뭐 캄캄허드락 막 쏟아지는디 어떻게 촌보(寸步)를 개리들 못허게 비가 와. 근게 가도 오도 못허고 인자 그렇게 생깄는디 원두막으 있다가서는,
“인자 이렇게 생깄은게 가지도 못허고 이 인력(日力)이 저물었은게 우리 집이 가십시다.”
가본게 단간방여 방이. 쪼그만헌 오두막 집이 단간방인디,
“그 밥을 좀 손님 왔은게 좀 채리라.”
시커먼 보리밥여. 시커먼 보리밥을 이렇게 참 채려왔는디, 참 두 내오간이 먹을 보리밥인디 손님 채린게 그 마누라는 굶는 거이지, 그리서 그놈을 대접했어. 대접히도 그날 저녁으 거시기 비는 안 개고, 거그서 원두막을 갈 판인디 원두막도 가도 못허고는 그 집이서 자는디 그 노인네는 그 인자 시원헌 디서 주무시라고 허고 자기 마누라는 부엌으서 자고 그 영감, 쥔허고 그 노인네허고는 방으서 자는 거여. 방이 쬐깐헌게, 거그서 자고서는, 근게 그 이튿날 아침까지 비가 안 개고 비가 와, 근게 그 또 밥을 히서, 보리밥을 히갖고 참 꼽쌀미를 혀가지고서 그 영감을 대접허는디 연 사날[사흘] 비가 와. 근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허고 한 사날을 말허자먼 대접을 받았어. 그러고서 인자 비가 슬슬 개는디 그 처는 부엌으서 잠을 자도 그 군소리 한 마디 않고, 안이서 그 있는 보리뱁이라도 비오닌게 가들 못헌다고 간다고 혀도 못가게 혀.
“비 갠 뒤여 가야지 안됩니다.”
꼭 붙들고서는 못가게 헌게 그 뱁을, 보리밥이라도 따숩게 히서 잘 대접허고 인자 그리서 대접을 받고 비가 개서 갈라고 허는디 가만히 본게 그분이 생인[상인(喪人)]이란 말여, 그서,
“보아허니 상준디(喪主인데) 어떻게 아버지 묘지나 혔냐?” 그런게,
“그 못혔다고. 못허고 지금 초분[초빈(草殯)]을 저렇게 히갖고 그 계시다.”고.
“그러냐고 안 되었다고. 내가 좀 땅을, 지를[지리]헐 종 아는데 하도 고마워서 내가 산을 두어 간디[곳] 일러 줄 틴게, 게 허라,”고,
“하, 그럴 수 있냐고. 참 감사헌 일이라고 참 고맙다.”고.
이렇게 허고서는 이 산이로 가자고 했어. 지금 나 사는 디 고 건너 가믄 노성 봉처라고 있습니다. 노성 봉처라고 임피면에 유명헌 명당여.
“여그를 쓰면은 큰 사람이 날 것여. 큰 사람이 나는디 눈을 뜨면 안총(眼聰)이 시어서 거그서 다 씨러지는 사람, 그러믄 그만큼 사람이 나먼은 그 뫼를 파다가 노와 봉용을 쓰시오. 노화 봉용을 쓰먼은 이게 대성을 헐 틴게 노와 봉용을 쓰시오.”
그려. 근게 그렇게 그이가 꼭 헐 예산을 허고서는 노와 봉용을 그 말뚝을 박았어. 철장을 딱허니 박아놓고서는 있는디, 가만히 그 사람이 인자 나이도 솔챈히 먹고 그렇게 허고 인자 사람이 났는디 눈을 감어야지 눈을 뜨먼 거그 있는 사람 다 자빠져 버려. 그만큼은 사람이 났어. 근디 그 분이 진사까지 혔지 거그 시방 묻혀 있어. 그 아들이 진사 벼슬 혔어.
그리갖고서는 그만큼 안총이 시고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지관 말대로 났어. 그러믄 파다 노와 봉용을 쓰얄 턴디 노와 봉용 애끼[아껴]놨어. 애끼놓고서는 자기가 죽으믄 들어갈라고. 이놈을 애끼 놓고 아들보고도 말 않고 일가보고도 말 않고 쉼겨 놨어. 자기만 아는 것여, 인자 나 죽으믄 여기다 써라 그렇게 헐 거여 인자, 사람 났으믄 끝까지 뭐 그 좋은 놈일랑은 내가 들어간다 이거여. 그 인자 딱 애끼놓고 철장만 박아놓고는, 애끼 놓고는 자기가 인자 호호하니 늙었단 말여. 늙어서 인자 병이 들어서 죽게 생깄어. 죽게 생긴게 아들을 데리꼬 가서. 에 하릴[할일]없는 게 죽게 되었단 말여 병들어서. 그때는 아들한티 일러줄라고 헌 것여. 아들한티 가서 일러줄라고 데리꼬 가는디 갈라고 막 허닌게 그냥 다리가 오그라져 붙어 버려. 다리가 딱 오그라져 붙어서 앉은뱅이가 되어 버리거든. 그렇게 가들 못허고 그냥 앉아 좌객(坐客)으로 되어 있어. 그런게 어디라고 막 어디가 쇠철장을 박어놓았은게 거그 가 파보면은 쇠살창 박은 디가 노와 봉용이, 나 죽으믄 거그다 묻으라고 헐락한게 그냥 벙어리가 딱 되어 버렸어. 그리갖고는 그 노와 봉용이 지금 잊어버렸어. 그리서 그 눈 뜨믄 자빠지는 사람 하나만 노성 붕처를 쓰고 났지. 그 분이 진사만 살어 먹었다 뿐이지 그냥 그냥 그 노와 봉용이 잊어먹어 버맀어. 지금도 그 자리를 몰라.
- 『군산 시사』(군산 시사 편찬 위원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