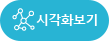| 항목 ID | GC01900800 |
|---|---|
| 한자 |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
| 유형 | 문헌/단행본 |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 집필자 | 이미숙 |
| 문화재 지정 일시 | 1981년 7월 15일 |
|---|---|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1981) 보물 재지정 |
| 성격 | 불경 |
| 관련인물 | 우왕 |
| 저자 | 당나라 종밀 |
| 편자 | 송나라 혜정 |
| 간행자 | 고식기|만회|상위 |
| 간행연도/일시 | 1378년 |
| 권수 | 2권 |
| 책수 | 상·하 1책 |
| 사용활자 | 목판본 |
| 가로 | 28.4㎝ |
| 세로 | 16.5㎝ |
| 표제 |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
| 간행처 | 충주 청룡사 |
| 소장처 | 동국대학교 |
| 소장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 문화재 지정번호 | 보물 |
[정의]
1378년(우왕 4) 충청북도 충주의 청룡사에서 간행한 불교 서적.
[개설]
『금강반야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또는 『금강경』이라고도 하는데, 금강석과 같은 지혜로 모든 고통의 고리를 끊어야만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의 근본 경전으로 『반야심경』 다음으로 널리 읽히는 경전이다. 1981년 7월 15일 보물 제720-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편찬/발간경위]
요진(姚秦)시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당나라 종밀(宗密)이 해석하여 『금강반야경 소론찬요』로 제목을 붙였는데, 이를 송나라의 자선(子璿)이 간정(刊定)하고, 다시 혜정(慧定)이 그 찬요의 요지를 알기 쉽게 조현하여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권 상·하〉라 하였다.
책 끝에 있는 고려 말의 고승 환암보제대선사(幻菴普濟大禪師)[호는 혼수, 자는 무작]의 발문을 통해, 1339년에 원나라에서 간행한 책을 원본으로 하여 고식기(高息機)가 판각을 계획하고 시주자의 도움을 얻어 만회(萬恢)와 상위(尙偉) 등이 1378년(우왕 4)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다시 새겨 찍어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지적 상황]
이보다 먼저 간행된 책으로 1352년(공민왕 1)에 희심(希諗)이 자원정사(資院政使) 고용복(高龍卜)이 시주한 재물로 개판한 판본과, 그 뒤 은봉(隱峯)의 중수를 거쳐 1373년(공민왕 22)에 배길만(裵吉萬)의 도움으로 중간한 판본이 있다. 또한 익산시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4호의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이 있다.
[형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1981)는 목판본으로 지질은 닥종이다. 책 크기는 세로 28.4㎝, 가로 16.5㎝이며, 전곽 크기는 세로 23.6㎝, 가로 36㎝이다. 본래 두루마리 형식으로 판각한 것을 선장(線裝)으로 개장한 것이기 때문에, 판식은 상·하단 변 무계·무판심의 한 판에 10항 15자 주쌍항으로 새겨져 있다.
표지는 청감색(靑紺色)이며, 왼쪽 상단에 금색으로 장방형(長方形)의 자모쌍선(子母雙線)을 긋고 그 안에 제목을 썼다. 그 위에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의 부호를 표시한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개법장진언의 부호는 고려와 조선 초기에 사용하였으며, 그 모양을 ‘이자불시 팔자불성(以字不是 八字不成)’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혹은 ‘학립사횡(鶴立蛇橫)’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1981)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그것을 다시 풀이한 책은 별로 알려지지 않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불교어, 고한자어, 이두식 표기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 『충주시지』(충주시, 2001)
- 김영진, 「충북지역의 고인쇄」(『박물관보』4, 청주대학교박물관, 1990)